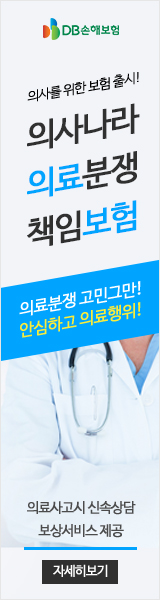비대면진료 확산 속 관리 사각지대 지속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비중 80% 이상
제도 보완 없이는 환자 안전·접근성 모두 위협
비대면진료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제도적 관리망의 허점이 드러났다. 원칙적으로 원격 처방이 불가능한 마약류,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이 지난 3년간 1만건 이상 발급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일부 의료인의 일탈을 넘어 제도 설계 자체의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비대면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은 총 1만354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84% 이상이 마약류였으며, 대부분은 향정신성의약품이었다.
한시적으로 원격진료가 허용됐던 2023년 상반기에만 9만건이 넘는 처방이 집중됐고, 이후 시범사업 체계 전환과 함께 건수는 줄었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문제는 현행 차단 장치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으로 금지 약물 처방을 막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이 의무화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이를 적용하지 않거나 비급여로 처방할 경우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제도가 존재해도 관리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한다. 규제가 존재해도 강제 장치가 없다면 현장에서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도 “대면진료가 원칙인 체계에서 비대면진료가 보완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제도 누수는 곳곳에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비대면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진료는 교통·시간 제약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중요한 대안이 됐다. 고령층, 직장인, 돌봄 공백 환자 등에게 여전히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서 접근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결국 핵심은 균형이다. DUR 사용을 의무화하고 처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비급여 처방까지 포함해 모니터링 범위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은 비대면진료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제도적 과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셈이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하준 다른기사보기